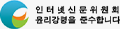실시간
뉴스
[취재수첩] 왜 ‘갤노트20 LTE’는 없죠?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5G 자급제폰으로 LTE 요금제 신규가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원래도 쓰던 LTE 유심을 끼우면 편법으로 가능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LTE로 신규개통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다른가 싶겠지만 나름대로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는 국회와 소비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며 5G 자급제 단말로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지난 20일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5G 전용으로만 출시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부터 갤럭시S·노트·폴드 라인업에서는 줄곧 5G폰만 출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20를 포함해 앞으로도 이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일까. 일단 제조사들의 의지다. 당초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5G 전용폰으로 출시된 갤럭시노트10에 대해 LTE 버전 출시를 권유했었다. 과기정통부 권고에 따라 통신3사에서도 8월 중순 구두로 삼성전자에 LTE 모델을 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최신 플래그십폰을 모두 5G로 출시했다.
사실 통신사들의 표정관리도 있다. 국내 제조사들에 플래그십 LTE폰 출시를 요청하긴 했지만 정부 등쌀에 떠밀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5G망 구축과 가입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고, LTE 대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높은 5G 효과도 톡톡히 봤다. 통신사에 LTE 버전은 있으면 그만, 없으면 좋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최신 단말기 자체가 5G에 편중된 점을 감안할 때, 5G 자급제폰의 LTE 서비스 가입을 허용한들 그것이 근본 대책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LTE 요금제 선택권을 넓힌 이유는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자는 취지다. 5G 서비스가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LTE 요금제를 쓰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5G폰으로 LTE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LTE 연동형인 5G 비단독모드(NSA) 규격을 따르고 있어서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미 5G 단독모드(SA)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조사들이 LTE 버전을 따로 출시하지 않는 이상 최신폰은 어쩔 수 없이 5G 요금제로만 써야 한다.
5G 요금 인하도 기대하기 어렵다. 단말기 자체부터 소비자 선택권이 5G에 머물러 있으니, 통신사들이 LTE 대비 5G 요금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할지 의문이다. 비싸고 한정적인 5G 요금제를 개선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LTE 가입을 허용해 쪽문만 열어둔 셈이다. 이것을 과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오피니언
-
SKT, 신규가입 전산 중단...“유심보호는 로밍이용자 제외 내일 중 마무리”
2025-05-05 12:51:55 -
“한국+일상+AI”...KT가 말하는 ‘K 인텔리전스’란?
2025-05-05 11:37:29 -
[팩트체크] SKT 해킹사고 관련 스미싱 문자, 어떻게 구분할까
2025-05-04 16:08:29 -
국회입법조사처 “SKT 위약금 자발적 면제, 법적 문제 없을듯”
2025-05-04 16:07:40 -
SKT, 5일 신규가입 중단 시작…“유심교체, 온라인 예약자 우선”
2025-05-04 11:39:40 -
SKT ‘최고단계 비상경영체제’ 선언...“위기 극복 온힘”
2025-05-03 12:35:23
-
CJ ENM, 美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독점 공급 계약 체결
2025-05-05 11:10:11 -
"가정의 달 수요 꽉 잡아라"…OTT, 'NEW 오리지널' 승부수
2025-05-04 16:08:04 -
[툰설툰설] 피와 복수로 써내려가는 액션… ‘무장 – 무투전’ vs ‘무적자’"
2025-05-04 14:23:30 -
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결정 불복… “닥사 기준 불명확, 가처분 소송 낼 것”
2025-05-03 12:17:21 -
엠넷 플러스, 오리지널 '숨바꼭질' 앱 가입 기여 1위…엔시티 위시 다음은?
2025-05-02 23:05:49 -
듀오링고, 148개 신규 언어 코스 출시…"한국어로 일어·중국어 배워요"
2025-05-02 17: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