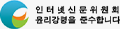실시간
뉴스
[취재수첩] 3600만원 ‘면죄부’ 논란이 던진 질문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이대로라면 더 강한 규제는 피하기 어렵다. 업계가 스스로 신뢰 회복과 자정 노력에 나서지 않는다면, 선택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구조와 확률을 허위로 고지한 국내 게임사 코그(KOG)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자사가 운영하는 게임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에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를 판매했다.
회사는 매 뽑기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3회차까지는 당첨 확률이 0%였고, 이후 뽑기 횟수가 누적될수록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식이었다.
심지어 소비자가 이미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확률이 더 낮아졌다. 예컨대 9개의 장비를 보유한 상태라면, 9회까지 당첨 확률이 0%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코그는 약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매출의 1% 수준인 3600만원에 불과했다. 코그가 제시한 보상안도 구매 수량에 따라 주문서를 다시 지급하는 선에 그쳤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공정위는 정확한 매출 규모와 부당이익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액과징금’ 방식을 적용했다. 글로벌 플랫폼(스팀) 기반 게임이고, 해당 아이템이 무료로 일부 제공됐으며, 대량 구매 시 할인율이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액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과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3600만원이라는 수치가 도출됐는지 외부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유저가 해당 아이템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몰입했는지, 커뮤니티 내 신뢰와 기대가 얼마나 붕괴됐는지와 같은 정성적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과징금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라기보다,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남은 것은 30억원을 벌고 3600만원만 낸 게임사와, 그 과정에서 속고 방치된 이용자뿐이다. 정보 비대칭 구조 속에서 기만을 방치하는 지금의 규제 시스템이 남긴 민낯이다.
지난해 2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해외 개발사와 중소 게임사를 중심으로 규제의 빈틈을 파고든 기만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적발 시 나오는 해명은 뻔하다. “기술적 오류였다”, “외주 개발사의 착오였다”는 식의 책임 회피가 반복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이용자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한탕 벌고 벌금 내면 끝’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게임 산업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결국 더 강력한 외부 규제를 자초하게 되고, 업계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한 기만이자 사기에 준하는 행위”라며 “3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는데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3600만원에 그쳤다. 이쯤 되면 처벌이 아니라 공인된 면죄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8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돼, 고의적 기만 행위에는 피해액의 3배까지 물게 된다”며 “고의로 기만하면 업체 퇴출도 각오해야 한다는 시그널이 필요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전면 실태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시간과 비용, 감정을 투자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다. 그만큼 사업자에게는 책임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신뢰를 팔아 수익을 내는 형태는 게임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갉아먹을 뿐이다.
강화되는 규제에 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고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이 먼저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오피니언
-
“예측 어려운 주파수 재할당대가, 사업자 투자에 영향 미칠수도”
2025-05-14 18:06:22 -
[DD퇴근길] 결단 내린 이재용…삼성, 獨 플랙트 2.3조 인수
2025-05-14 17:19:07 -
“먹방은 방발기금 왜 안 내나…뒤바뀐 방송환경, 부과대상 넓혀야”
2025-05-14 17:16:50 -
KT알파, 올 1분기 호실적…T커머스·모바일상품권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
2025-05-14 16:11:11 -
구현모 “응용AI 만이 살 길”…우수사례로 ‘LG AI 연구원’ 언급
2025-05-14 15:39:20 -
갤S25 엣지 공시지원금, 최대 25만원…KT가 제일 많아
2025-05-14 15:33:20
-
크래프톤, '어비스 오브 던전' 동남아·중남미에 6월 출시
2025-05-14 18:04:46 -
"사진 한 장이면 영상 뚝딱"…틱톡, AI 얼라이브 기능 출시
2025-05-14 17:59:42 -
"검은사막 6주년 기념"…펄어비스, '530 페스티벌' 시작
2025-05-14 17:34:05 -
"이제 숏폼도 순차 재생"…카카오표 '다음 루프' 통할까 [IT클로즈업]
2025-05-14 17:19:25 -
[DD퇴근길] 결단 내린 이재용…삼성, 獨 플랙트 2.3조 인수
2025-05-14 17:19:07 -
2025-05-14 17: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