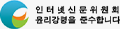실시간
뉴스
[취재수첩] 딥시크가 남긴 교훈, 반도체 편향 정책에서 벗어나야
![[ⓒ챗GPT-4o가 생성한 이미지]](https://www.ddaily.co.kr/photos/2025/01/21/2025012119300990518_l.jpg)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시장 트렌드 변화 속도는 무서움을 넘어 공포스러울 정도다. 국내 AI 개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하나 같이 하루하루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기분이라는 소감을 전해듣는다. 빠른 변화만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느라 업계 전체가 시름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 일례로, 최근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대형언어모델(LLM) ‘딥시크-알원(DeepSeek-R1, 이하 R1)’의 등장은 AI는 물론 전 산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다. 딥시크는 적은 개발 비용과 저사양 반도체를 통한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쩐의전쟁’으로 불리던 AI 모델 경쟁에 새로운 트렌드 흐름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업계 입장에서 해석하면,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흘러가던 AI 전쟁이 소프트웨어(SW)와 서비스 등의 경쟁력도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딥시크가 R1 개발비용을 축소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의혹도 제기됐지만, AI 업계는 적어도 딥시크 파장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인지했다. AI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면, 대규모 자금 확보가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및 엔지니어링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AI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란 기대감이다.
하지만, 국회 및 정부 등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서는 AI 트렌드 변화 속도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AI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SW)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유난히 목소리가 작다. 주된 관심은 여전히 ‘반도체 리더’에 집중된 모습이다. 딥시크 파장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여전히 반도체 기업 지원 정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반도체기업에 대한 지원은 ‘반도체 특별법’을 필두로 논의가 활발한 반면,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기업을 위한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는 큰 흐름 속 곁다리로 이야기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개최한 딥시크 파장 간담회에서도 기존 정책인 ‘AI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을 살피고, AI 관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논의만 이뤄질 뿐, AI 서비스 및 SW 역량 강화를 위한 직·간접 지원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추경 논의 과정에서도 반도체 기업 지원 필요성은 명문화된 발의안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AI 서비스 및 SW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선택지로 분류하는 분위기다. 딥시크 파장이 전한 ‘SW와 서비스 개발 역량의 중요성’ 교훈은 여전히 관심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쟁력 약화와 엔비디아의 시장 장악으로 인해 반도체 기업 지원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AI 산업이 글로벌 패권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딥시크 파장을 통해 SW 산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 기업 정책에만 집중하는 것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회와 정부는 ‘AI 골든타임’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기존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I 기술 격차는 한 번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SW 및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변화하는 AI 시장 흐름을 정확히 읽고,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오피니언
-
“권력적 방송심의는 흉기…사업자 중심 자율심의가 시대정신”
2025-05-17 14:30:00 -
[OTT레이더] ‘배구여제’ 김연경의 마지막 스파이크…생중계로 감상해볼까
2025-05-17 10:09:44 -
과기정통부, 현대홈쇼핑·NS쇼핑 재승인 결정…2032년까지
2025-05-17 05:06:24 -
알뜰폰 증가률 1%대 회복…1만원 5G 요금제 효과 가시화?
2025-05-16 17:40:35 -
[현장] 서울 성수서 셀럽 사로잡은 ‘칼 라거펠트’ 철학…“한국 사랑 돋보이네”
2025-05-16 14:59:11 -
2025-05-16 13:53:40
-
이해진 네이버, 첫 해외 일정으로 실리콘밸리行…글로벌 AI 투자 본격 시동
2025-05-16 18:43:15 -
"경찰도 전기자전거 구독"…스왑, 서울경찰청 시범 공급
2025-05-16 18:42:14 -
NOL 인터파크투어, 항공권 취소·환불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 진행
2025-05-16 17:32:09 -
[DD퇴근길] "구글에 지도 반출하면 생태계 무너질 것"…스타트업, 한 목소리
2025-05-16 17:22:59 -
아디다스 고객 정보 유출…"2024년 이전 고객센터 문의자 대상"
2025-05-16 17:22:14 -
네이버, 디지털상공인 연합 기획전 진행…"소성공인과 동반 성장"
2025-05-16 16: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