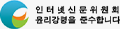실시간
뉴스
美 투자 속도내는 SK온…블루오벌SK·현대차 JV 가동 임박 [소부장박대리]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SK온이 미국 내 현지 공장 본격 가동을 위한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포드와 합작한 '블루오벌SK'의 켄터키 공장의 양산 시작 시점을 조정하는 한편, 2분기 중 현대차와의 조지아 합작법인 설비도 구축해 내년 양산에 나선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블루오벌SK의 켄터키 공장 양산 시작(SoP)을 위한 설치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가동을 시작한다.
블루오벌SK는 SK온과 포드가 2022년 투자를 발표한 이래 출범한 합작법인이다. 켄터키주에 2개의 공장, 테네시주에 1개의 공장이 설립될 예정이다. 만약 해당 법인이 기존 목표치대로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SK온은 블루오벌SK를 통해서만 연산 127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가동될 켄터키 1공장에서는 포드의 'F-150 라이트닝'용 배터리가 양산될 것이 유력하다. SK온이 조지아 단독 공장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블루오벌SK로 이관, 공동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받기 위함이다. 최근부터는 기존 포드로 향하는 물량 생산이 일부 탄력성을 띠면서 헝가리 공장 등에서도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켄터키 2공장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2026년으로 예정돼 있던 가동 시기가 소폭 연기됐다. SK온이 수주한 닛산향 배터리 물량이 2028년 양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맞춰 가동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규모가 큰 켄터키 1공장의 일부 라인이 설치가 되지 않은 만큼, 1공장에서 닛산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SK온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조지아주에서 짓고 있는 합작공장의 가동도 조만간 준비한다. 2분기 말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샘플, 시생산 등을 거쳐 내년 양산하겠다는 목표다. 해당 라인의 양산이 시작되면 현대차그룹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앨라배마, 기아 조지아, 신공장 HMGMA 등에 납품될 것으로 에상된다.
SK온이 전기차 수요 불황에도 투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적용에 따른 장비 수입 비용 증가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현지 생산 요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각국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가 발표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현지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상호관세 적용이 90일 유예되며 7월로 미뤄지기는 했으나, 현재 10%의 관세가 적용 중인 점과 여전한 불확실성이 속도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테네시 공장의 경우 장비 등이 우선 반입됐으나 실제 양산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포드향 물량이 1공장과 헝가리 공장 등으로 충당되는 만큼, 급하게 가동을 앞당겨 고정비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뒤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영향이 장비 반입에도 적용되면서 우선 이를 설치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SK온 서산공장 [ⓒSK온]](https://www.ddaily.co.kr/photos/2024/07/23/2024072315495844609_l.jpg)
업계에서는 미국 내 배터리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라인 설치 계획에도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기존 고객사로의 전기차용 배터리 양산 라인은 유지하되, 일부 비가동 라인을 전환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ESS용 배터리 등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온은 충남 서산에서 LFP 배터리 양산을 준비 중으로, 이를 전기차와 ESS에 탑재하기 위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초 검토했던 중국 옌청 등으로의 LFP 라인 전환 투자는 수익성 및 투자비 부담으로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나, 장기적으로는 비(非)중국 배터리를 요구하는 미국 시장을 진출할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지금 흐름을 보면 추가 증설은 줄이되 예정했던 신규 공장의 라인 설치 시기는 앞당기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관세 영향은 피하면서도 타 응용처로의 전환까지 염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 등지에서 LFP·ESS 전환 투자를 시작한 만큼, SK온과 삼성SDI 등도 유사한 흐름을 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오피니언
-
SKT ‘최고단계 비상경영체제’ 선언...“위기 극복 온힘”
2025-05-03 12:35:23 -
유상임 장관, KISA 현장 점검…“SKT 사태, 사이버보안 경종 계기”
2025-05-03 11:56:25 -
SKT, 연휴 첫날 출국자 유심교체 총력…“92만명 유심교체 완료”
2025-05-03 11:56:06 -
[OTT레이더] ‘알파고’ 이긴 이세돌 등장…두뇌 전쟁 ‘데블스플랜 시즌2’
2025-05-03 07:00:00 -
“통신 속도 느린데, 요금 전부내야 할까?”...방통위,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2025-05-02 23:06:07 -
"유심이 입고됐습니다" SKT 해킹사고 악용한 '스미싱 문자' 주의보
2025-05-02 17:27:57
-
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결정 불복… “닥사 기준 불명확, 가처분 소송 낼 것”
2025-05-03 12:17:21 -
엠넷 플러스, 오리지널 '숨바꼭질' 앱 가입 기여 1위…엔시티 위시 다음은?
2025-05-02 23:05:49 -
듀오링고, 148개 신규 언어 코스 출시…"한국어로 일어·중국어 배워요"
2025-05-02 17:19:19 -
"AI 예산 215억 확보"…문체부, 100% AI 영화 제작 지원한다
2025-05-02 17:13:34 -
[네카오는 지금] 불붙은 AI 지도 경쟁…수익화·외국인 공략까지 ‘진화 중’
2025-05-02 16:49:15 -
‘해킹 사태’ 위믹스, 사상 초유 재상폐… 위메이드 ‘치명타’
2025-05-02 15: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