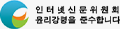실시간
뉴스
美 트럼프 변덕에 출렁이는 스마트폰 업계…관세 불확실성은 '현재·미래 진행형'
![상호관세 발표 중인 트럼프 대통령 [ⓒEPA 연합뉴스]](https://www.ddaily.co.kr/photos/2025/04/14/2025041417044038916_l.jpg)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관세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에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가 요동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업계 훈풍이 기대됐으나,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관세를 번복하고, 오히려 부과 의지를 다졌다.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또다시 고심에 빠지게 됐다.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지난 금요일, 관세 예외를 발표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제품들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11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가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CBP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노트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장비 등 20여 개 전자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에 부과한 125%, 그외 국가에 대한 10% 상호관세를 해당 품목에는 일시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급격히 냉각된 미국 소비자들의 민심 회복과 더불어 자국 기업인 애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텃밭인 미국에서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은 과반을 넘어선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 내 아이폰은 65% 점유율에 달했다.
53% 점유율을 기록했던 지난 3분기 대비 12%포인트나 점유율이 증가했는데, 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관세 우려에서 기인한다. 관세는 수입국의 법인과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관세가 올라갈수록 미국 내 제품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결국 소비자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된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총탄은 주로 중국을 향하는데, 중국은 거대한 아이폰 생산기지다.
IT매체 씨넷 등에 따르면 1199달러인 아이폰16 프로맥스에 125% 관세가 붙으면 2698달러로 치솟는다. 미국 소비자들이 이 같은 아이폰 가격 인상 공포로 인해 제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미국 내 아이폰 점유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 입장에서도 중국을 향한 미국 정부의 관세 총구는 큰 부담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 입맛에 맞게 상호관세 항목을 재조정한 것이다. 강력한 관세정책을 고수해 온 트럼프가 결국은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달래고자 특혜를 준 것은 결국 정책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트럼프가 직접 등판해 자신의 관세정책이 후퇴하지 않았음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도 상호관세가 면제된 첨단 제품에는 한 달 뒤 반도체 품목 관세에 포함시키겠다고 시사하며, 트럼프 발언에 힘을 보탰다.
사실상 스마트폰 과세가 영구 제명이 아닌, 일시 제명으로 못 박은 셈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는 CBS방송에 출연해 "리쇼어링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자제품에 단지 다른 체계가 적용되는 거다. 잠재적 관세 부과 대상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제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도감에 휩싸였던 스마트폰 업계는 현재는 물론, 미래진행형 관세 정책에 다시 골머리를 앓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미 지난 3월부터 대형 화물기를 동원해 인도에서 생산한 아이폰을 미국 현지로 실어 날랐다.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제품을 하늘길로 수송하기 위해 인도 폭스콘 공장을 풀가동 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 이를 계기로 애플의 인도 생산 비중은 본격 확대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역시 미국발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미향 삼성전자 갤럭시의 다수를 생산하는 베트남이 46% 상호관세율이 측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비교적 상호관세율이 낮은(26%) 인도 생산기지 확대에 무게가 실린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스마트폰 관련 면제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도 내 생산량 증가를 내다봤다. 해당 업체는 "삼성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인도에서 상당한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 다른 업체들보다 베트남에서 인도로의 이전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은 인도에 두 개의 공장을 보유했는데, 한 곳은 생산 능력을 확충해 생산 가능하다. 또한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승기를 거두면 한국 공장의 프리미엄 모델도 수출도 일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오피니언
-
SKT 해킹은 北 소행?…과기정통부 "확인된 바 없어"
2025-05-21 17:05:11 -
[DD퇴근길] "AI 강화된 iOS19"…애플, WWDC25서 보여줄 혁신은
2025-05-21 17:04:30 -
'미안하다, 사랑한다' 역주행 인기…웨이브서 20대 시청시간 67배 '껑충'
2025-05-21 16:43:42 -
이진숙 방통위원장 “해킹 안전지대 없다…통신3사 보안 집중점검”
2025-05-21 16:03:40 -
IPTV, 새로운 시청률 지표 선보인다…통합 시청데이터 플랫폼 출시 ‘초읽기’
2025-05-21 15:51:16 -
과기정통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2025-05-21 15:00:00
-
[DD퇴근길] "AI 강화된 iOS19"…애플, WWDC25서 보여줄 혁신은
2025-05-21 17:04:30 -
“연애만 하냐고? 친구도 만든다”…틴더, Z세대 데이팅앱 사용법 공개
2025-05-21 17:02:15 -
휘슬, 경기도 용인특례시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범위 넓힌다
2025-05-21 16:43:52 -
위믹스, KISA 인증 보안업체 점검 결과 '양호'…"보안 문제 없다"
2025-05-21 15:50:38 -
웹툰도 ‘쇼츠’ 시대…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숏폼 경쟁 본격화
2025-05-21 15:50:00 -
2025-05-21 1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