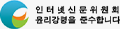실시간
뉴스
인터넷
‘본인확인’ 통신사 독주체제…“네이버·카카오는 왜 못하나요?”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통신3사의 본인확인시장 독주체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아쉬움도 나온다. 인증서 관련 신사업을 준비하던 기업들에도 제동이 걸렸다. 다양한 서비스 진입을 위해서는 인터넷기업에 대한 벽을 낮추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비바퍼블리카(토스)는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당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심사 결과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신청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본인확인기관이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으로써 연계정보(CI)를 제공해 본인확인을 진행하는 곳을 말한다. 방통위 심사를 거쳐 지정된 본인확인기관만이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CI를 제공할 수 있다. 통신3사가 서비스하는 패스(PASS)의 본인확인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앞서 3사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둔 지난해 9월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했으나 방통위로부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정이 불발됐다. 방통위는 네이버·카카오에 대해 “계정 탈취와 명의도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토스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실명 계정 소유자와 본인확인 명의자가 같은지, 즉 ‘동일성’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이용자의 ‘유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난관이 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결정에 의문 부호도 나온다. 본인확인기관 신청을 한 해당 기업들 가운데 한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모두 은행·증권·간편결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본인확인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수 아이디라 하더라도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면 유일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기업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하기는 아예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소라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본인확인기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나온 결과에 대해 부언하기는 어렵다”면서 “원칙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향후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정부가 특정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 기업은 작년 모바일 인증서 시장에 본격 진출한 이후 적극적으로 제휴처를 늘리며 신규 서비스를 출시해왔으나, 정작 본인확인은 자체 앱내에서 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회원가입 또는 비밀번호 변경 등 절차시 본인인증이 필요할 때 패스 등 다른 앱을 거쳐야 해 편의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기존 핀테크 사업과의 연계나 디지털 신분증 관련 정부 사업 입찰에도 장벽이 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불발이) 기존 인증 서비스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사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은 맞다”면서 “이용자 측면에서도 본인확인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경쟁이 늘면 그만큼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사라고 해서 보안 위협이 항상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민간 인증 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니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3사가 이번 심사에서 최종 탈락함에 따라 통신3사의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 주도권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현재 1000억원 규모의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은 통신3사가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인터넷기업들은 통신사에 건당 30~40원씩 매년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3사의 경우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 보안 수칙을 준수하고 엄격한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용자 편의 제고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성 확보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오피니언
-
SKT, 유심교체 속도·방문서비스 본격화…정부 “유출 모니터링 강화”
2025-05-21 11:24:18 -
NS홈쇼핑, 5년 연속 KMAC 선정 ‘우수콜센터’ 등극 비결은
2025-05-21 10:50:34 -
GS샵, 첫 셀럽 방송 ‘요즘언니 with 양정아’ 론칭
2025-05-21 10:02:10 -
LGU+, ‘고객감동콜센터’ 인증 획득…“AI 활용 성과”
2025-05-21 09:55:39 -
2025-05-21 09:46:31
-
[DD퇴근길] 지브리 프사로 촉발된 'AI 저작권'…"법·정책 논의 필요해"
2025-05-20 17:15:02
-
펄어비스, '검은사막 하이델 연회' 내달 28일 대전서 개최
2025-05-21 14:15:11 -
2025-05-21 14:13:20
-
2025-05-21 12:25:49
-
하이브IM, 신작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 연내 출시 확정
2025-05-21 12:19:54 -
함저협, 새 사무실 이전…"사업·조직 확장으로 도약하겠다"
2025-05-21 11:23:51 -
원웨이티켓스튜디오, 신작 '미드나잇워커스' 게임스컴 출품
2025-05-21 10:31:49